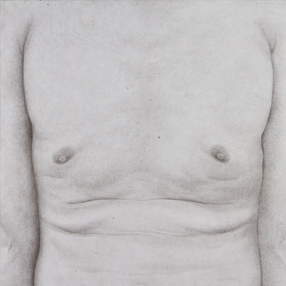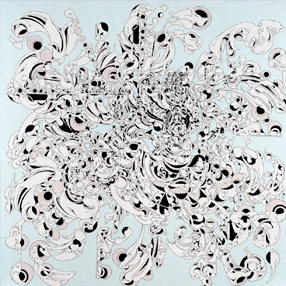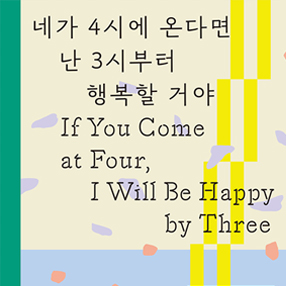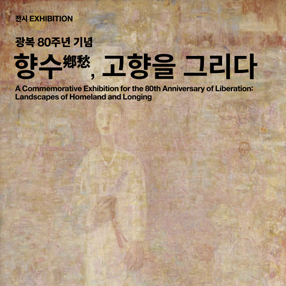본문
-
이만나
깊이 없는 풍경 The Landscape with Depth, oil on canvas, 90x150cm, 2006
-
이만나
날개 Wing, oil on canvas, 155x200cm, 2008
-
이만나
더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 The landscape that_s no longer there, oil on canvas, 150x200cm, 2008
-
이만나
모퉁이 Corrner, oil on canvas, 30x40cm, 2008
-
이만나
모퉁이 Corrner, oil on canvas, 30x40cm, 2008
-
이만나
무대 The Stage, oil on canvas, 30x40cm(each), 2006
-
이만나
사이프러스가 있는 풍경 The Landscape with Cypress, oil on canvas, 170x227cm, 2009
-
이만나
여름 2009 Summer 2009, oil on canvas, 170x227cm, 2009
-
Press Release
이만나 - 깊이 있는 표면
박영택 (경기대학 교 교수, 미술 평론가)
이만나의 그림은 어둡고 흐릿하며 깊다. 가물가물한 그림의 피부에는 물감의 얼룩과 흔적들이 뿌옇게 성에꽃처럼 피었다. 그 꽃들이 순간 풍경이 되고 나무가 된다. 그는 도시의 야경과 나무, 담쟁이 등을 그렸다. 자신의 일상의 동선에서 늘 상 보던 것들이다. 매번 보아서 익숙하고 잘 알 것 같은 대상들이지만 볼수록 그것들은 낯설고 기이하다. 특히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움을 고양시키는 밤은 그 낯설음을 증폭시킨다. 그는 부분적으로 빛의 편애를 받는 건물과 정원, 나무를 섬세하게 주목했다. 그가 본 자연은 인간의 관리와 통제 속에서 심미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된 상태로 길들여진 이른바 ‘가축화된 자연’이다. 사람들은 여러 목적에 의해 풀과 나무를 잘라내고 가꾸고 보듬는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가꾸어지고 관리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넘어서면서 경계를 지워 나가려 한다. 가둘 수 없고 관리될 수 없는 자연이다. 그래서 숲, 풀이 지닌 생명력은 무섭기도 하다. 밤은 그 야생의 자연이 지닌 신비스러운 힘들을 풀어 놓는다.
자신의 일상에서 매번 접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풍경들이 어느 날 낯설고 기이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는 그런 의문,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분명 내 내부에서 감지하는, 더구나 욕망하는 힘에 의해 그 대상을 다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그렸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간 동안 그는 알 수 없는 의문과 지속적으로 대면한다. 결국 그가 그린 것은 특정 대상의 외양이 아니라 그로부터 촉발된 자기 내부의 컴컴한 초상이다. 세계는 주체에게는 늘 수수께끼다. 그러니까 카뮈 식으로 말하면 부조리하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언어와 문자의 틀들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지식은 날 것의 세계, 대상 앞에 한없이 무력하다. 외계는 내 내부로 들어와 매 순간 암전된다. 결국 재현은 불가능하고 자꾸 미끄러진다.
이만나의 그림은 분명 특정 대상의 재현이고 가시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이면을, 세계의 내부를,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를 관습이 아닌 그것 자체로 생생하게 접촉할 때 생기는 생소함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소멸된 사물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순전히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다. 기능과 의미가 지워진 자리에는 기묘하고 낯선 이미지만 남게 된다. 이런 생경한 이미지로부터 사물은 비로소 의미의 대상이 아닌 ‘의미의 주체’가 된다. 알려진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지워진 지점에서의 사물과의 우연한 만남, 맞닥뜨림, 그리고 이로부터 또 다른 가능한 세계와 대면하는 것이 그의 그림이다. 그것은 분명 여기, 이곳의 풍경이지만 동시에 이곳에 없는 풍경이기도 하다. 일상과 비일상 사이에 있는 묘한 풍경이다. 있으면서 부재한, ‘없지 않은’ 그런 풍경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과 비현실, 시각과 비시각,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 위치한 모호한 풍경이 되었다. 모든 대상은 표면, 피부만을 보여주지만 작가는 그 이면을 생각해본다. 분명 껍질은 본질은 아니지만 그 이면을 상상하게 해주는 불가피한 표면이다. 표면을 통해 무한한 공간을 연상해보고 들어가 본다. 그림이란 것 역시 부득이 사물의 외피를 주어진 캔버스의 표면 위로 밀착시키는 일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내부를, 어떤 이면을 암시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무 깊은 표면이 된다.
그는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그 현재라는 시제에 만난 것, 어떤 것이 이 순간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전의 체험에서 문득 낯선 느낌을 받는다. 그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낯설게 다가옴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강한 힘을 발산한다. 낯설음이란 특정한 외부의 경험에 의해 생성된 내적인 심리상태를 지칭한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지금의 풍경, 대상을 의심한다.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계는 아니다. 특정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온갖 형상들도 상상되고 이질적인 것들이 겹쳐 보인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신화 속 풍경 같다. 그는 인간이 감지하는 이 세계 외에 어떤 것을 본다. 보고자 한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 느닷없이, 불현듯 나타나는 것들을 만난다. 현실세계에 비이성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가 순간 침입한 것이다. 순간 현실은 금이 가고 ‘이격 離隔’된다. 작가는 그런 풍경을 ‘헤테로토피아’로 설명한다.
그는 일상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참조해서 그림을 그렸다. 목탄으로 드로잉을 한 후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덮어나가면서 어떤 장면을 재현한다. 아니 비재현적으로 재현한다. 스스로 재현하는 것 말고 우연적 효과, 의도하지 않는 상태로 해결하고 싶기에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칠해나가면서 그려나간다. 따라서 물감의 입자, 얼룩, 방울들이 모여서, 집적해서 두툼한 풍경의 깊이를 얇게 만든다. 그 위로 스며들고 얹혀 지는 붓질은 자신이 대상으로부터 받은 기이한 느낌을 질료화 시킨다. 촉각적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기운이 모락거리는 공간 위로 오밀조밀하고 ‘끈적한’ 터치들이 부유한다. 그것은 또한 대상에서 받은 미묘한 차이점을 잡아채려는 시도다. 일정한 호흡, 열기가 서려 있는 그 붓질은 세계의 표면을 더듬고 주어진 캔버스의 물리적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이지만 그 이면으로 향한 불가피한 통로를 가설하고 있는 중이다. 낯설고 비현실적인 것을 느끼고 감지시키는 세계의 피부를 더듬고 있는 그의 그림은 결국 습관에 의해 가려진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유도한다. 그림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비전과의 투쟁’인 것이다.전시제목깊이 있는 표면
전시기간2010.04.22(목) - 2010.05.09(일)
참여작가 이만나
초대일시2010-04-22 18pm
관람시간11:00am~18:00pm
휴관일 월요일 휴관
장르회화
관람료무료
장소브레인 팩토리 Brain Factory (서울 종로구 통의동 1-6 )
연락처02-725-9520
-
Artists in This Show
-
1971년 출생
-
브레인 팩토리(Brain Factory ) Shows on Mu:umView All
Current Shows
-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수원시립미술관
2025.04.15 ~ 2026.02.22
-
취향가옥 2: Art in Life, Life in Art 2
디뮤지엄
2025.06.28 ~ 2026.02.2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봄의 선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5.09.05 ~ 2026.02.22
-
광복 80주년 기념 «향수(鄕愁), 고향을 그리다»
국립현대미술관
2025.08.14 ~ 2026.02.22
-
이강소_曲水之遊 곡수지유: 실험은 계속된다
대구미술관
2025.09.09 ~ 2026.02.22
-
전국광: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5.09.24 ~ 2026.02.22
-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
전북도립미술관
2025.11.14 ~ 2026.02.22
-
허윤희: 가득찬 빔
대구미술관
2025.11.04 ~ 202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