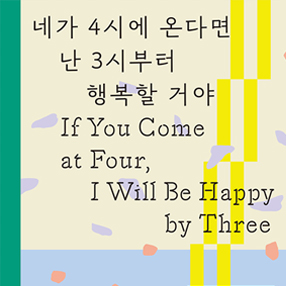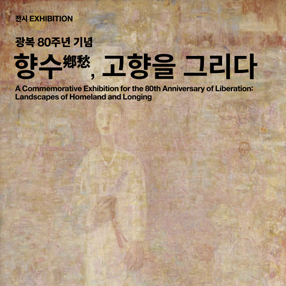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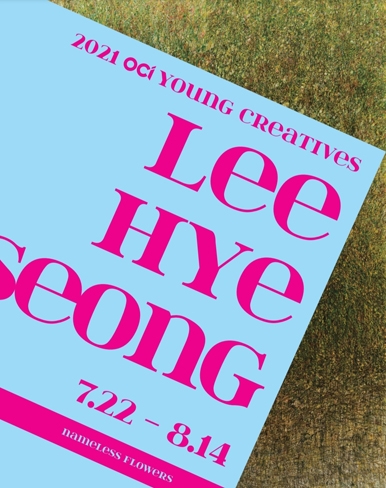
전시 포스터
-
이혜성
Elysion, oil on canvas, 465x336cm, 2021
-
이혜성
Elysion, oil on canvas, 465x336cm, 2021
-
이혜성
Black Plants, oil on canvas, various dimensions, 2021
-
이혜성
Nameless Flowers, oil on canvas, 130x970cm, 2021
-
이혜성
Nameless Flowers, oil on canvas, ea)112x194cm, 2021
-
이혜성
Scent, water and oil on canvas, 31.5x40.8cm(x20), 2021
-
Press Release
Nameless Flowers
꽃을 품은 식물 더미가 퍼져나간다. 튀어 오르듯 반짝거리더니 이내 서로 파묻히고 뒤엉켜 앓다가 긴긴 어둠에 묻혀버린다. 거대한 순환고리의 일부인 인간의 생과 사를 상기시킨다. 선택지 없이 태어나 마른 풀처럼 바스러지고 마는, 살았는지도 모르게 잊히는, 신이 우리의 양손에 고이 감싸 들려준 공허.
헛되이 점철되어가는 일상에서 소멸과 죽음은 가장 강력한 사유의 도구가 된다. 이혜성은 이름 없는 꽃들이 소멸하는 모습을 보며 영생을 떠올린다. 이어서 축복의 땅을 촘촘한 붓질로 쌓아 올리고 속죄와 구원의 신비로 가득한 실낙원을 함께 내건다.
그렇게 유한한 존재에 대한 염려는 피어나고 지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연약한 전신으로 맞서는 귀결의 순간을 그리며, 존재하기에 사라지고 사라지기에 아름다운 모든 생명을 노래한다.
■ 이영지(OCI미술관 큐레이터)
꽃 무덤, 그러므로 어쩌면 상실된 죽음, 비극, 그리고 숭고
지금은 시대가 변해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 입시화실에는 전형적인 풍경이 있었다. 데생을 위한 석고상과 수채화를 위한 정물 대가 그것이다. 앉아서 그릴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 보를 깐 좌대 위에 화병이 놓여 있었다. 화병에는 각종 꽃이 장식돼 있었는데, 혹여 꽃이 시들 새도 없이 화사한 새 꽃으로 바꿔놓곤 했다. 입시 때문이겠지만, 꽃 하면 입시가 생각나고, 생화가 떠오른다. 세대 감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기념일이나 기념할 만한 일을 떠올릴 것이다. 졸업이나 결혼 그리고 생일 같은. 요새는 굳이 기념이 아니라도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꽃을 빌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마음을 대신하는 만큼 더 화사하고, 더 예쁜 생화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작가 이혜성 역시 꽃을 그리는데, 꽃 자체도 예사롭지 않고, 꽃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당연하지 않기(그러므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들려주는 것, 곧 역설에 작가의 작업의 특이성이 있다. 그리고 곧잘 예술은 역설에 많은 부분 빚지고 있다. 그러므로 역설을 매개로 한 작가의 기획은 예술의 본성이며 그 실천 논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작가의 꽃 그림은 어떻게 예사롭지도 당연하지도 않은가. 작가의 화실에는 꽃이 수북하다. 이런저런 경로로 작가가 선물 받은 꽃도 있고, 주변에서 얻거나 일부러 수집한 꽃들이다. 그런데 꽃이 무색할 정도로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마르고 시든 꽃과 함께, 짓무른 꽃이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피어있다. 그 규모나 상태로 보아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축적되고 부패가 진행된 것일 터이다. 시든 꽃, 마른 꽃, 죽은 꽃 천지가 꼭 꽃 무덤이라도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죽은 꽃 그러므로 꽃의 주검을 그리는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시간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과 사가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대면이라도 하는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 아마도 이 모두가 작가가 굳이 죽은 꽃을 그리는 이유일 것이다.
혹여 작가는 죽은 꽃을 애도하는 각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죽은 꽃에 천착하는 유별난 취미라도 가지고 있는가. 유별난 취미? 주지하다시피 미술사에는 죽은 꽃(보다는 죽을 꽃)에 유독 의미를 부여했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크미술의 바니타스 정물화가 그렇고, 죽음이 삶(그러므로 생)을 정화 시킨다고 믿었던 낭만주의가 그렇다. 비록 낭만주의에서 그 매개는 정물보다는 풍경이었지만, 사실 작가의 그림에도 풍경적인 요소가 있고(특히 여백이 없이 풀사이즈로 그린 그림에서 더 그렇다), 나아가 정물 자체를 일종의 작은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동양이라고 해서 그 경우가 다르지는 않다. 화무십일홍, 곧 십 일 동안 빨간 꽃은 없다. 화사한 꽃일수록 더 빨리 시들고, 예쁜 꽃일수록 더 빨리 죽는다. 그러니 모든 삶은 삶(그러므로 어쩌면 욕망) 자체에 함몰되기보다는, 언제나 죽음을 그 거울로 삼을 일이다. 작가의 죽은 꽃 그림에는 이런 전언이 깔려있고, 존재론적 거대 담론이 내재 돼 있다. 좀 극적으로 말해 거대 담론이 죽은 시대에,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서사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시절에 들려주는 이야기여서 그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작가는 그렇게 이 모든 죽은 꽃 그림을 일일이 세필로 그렸다. 그렇다고 정밀화나 하이포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세필을 곧추세워 그린, 작정하고 그린 그림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로 스케치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그려 들어가는 것이나, 여기에 세필을 큰 붓과 다를 바 없이 툭툭 찍어서 터치를 쌓고 점을 찍어 올리는 과정에 더러 물감이 화면 아래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곧잘 비정형의 얼룩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세밀화보다는 회화적으로 보이고, 세부가 살아있는 핍진성(닮은꼴) 대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조돼 보인다. 사물 대상 자체를 묘사하는 것에 충실했다기보다는 감각의 논리(그러므로 어쩌면 몸의 생리)에 힘입어 회화적으로 각색했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여하튼 하나하나 세필로 그린 것이므로 노동집약적인 그림이며, 집요한 그리기의 경우를 예시해주고 있다.
문제는 흔히 분위기가 강조되는 그림에서 회화적인 밀도감은 성글기 마련인데, 정작 하나하나 세필로 그린 그림이며 빈틈이 없는 화면이 특유의 내적 울림을 자아낸다는 점이다. 그렇게 그림은 비록 죽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고, 정지된 것이지만 움직이는 것 같다. 다시, 그렇게 그림은 죽은 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고, 죽음에 잠재된 생, 그러므로 다른 생을 예비하는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 같다. 어쩌면 자연은 살아 있다고, 심지어 죽었을 때조차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상상력의 비약이라고 할까. 분명한 것은, 자연은 다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며, 항상적으로 변하고 현재진행형으로 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작가는 어쩌면 삶을 잠재하고 있는 죽음,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삶의 상호작용과 간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에서 죽은 꽃은 죽음 자체보다는 사실은 삶을 위한 것이고, 정작 삶을 위한 거울의 메타포가 된다. 매 순간 죽음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알레고리 곧 유비를 끌어들이는데, 단테의 이 그렇고, 존 밀턴의 이 그렇고, 존 번연의 이 그렇다. 여기서 신곡은 사후세계를 그린 것이고, 실낙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낙원을 그린 것이고, 천로역정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구원의 여정을 그린 것이다. 본문에 나타난 특정 구절을 차용해 회화적으로 각색한 것인데, 주인공이 겪는 심경의 변화를 죽은 채로 일렁이는 꽃 무리에, 죽은 듯 살아있는 꽃무덤에 비유해 그린 것이다.
특이한 것은 실낙원의 경우인데, 가장 오래된 정원이며 미지의 풍경인 만큼 인터넷 리서치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신비로운 꽃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렸다. 작가의 다른 그림들과 사뭇 혹은 많이 다른데, 태초의 암흑을 배경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금색의 꽃들이 중세 이콘화를 상기시킨다. 식물과 동물이 나뉘기 전의(그러므로 어쩌면 빛과 어둠이,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나뉘기 전의) 원초적 생명을 보는 것도 같고, 그 자체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밀란 쿤데라는 현대인이 비극적인 것은 비극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조르주 바타이유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마도 죽음이야말로 지극한 비극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비극을 상실했다는 말은 곧 죽음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비극의 존재 이유는 숭고에 있고, 죽음 역시 인간을 숭고하게 만든다. 다시, 그러므로 비극을 상실했다는 말은 죽음과 함께 숭고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삶과 죽음은 원래 연속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삶이 죽음을 변방으로 내몰게 된다. 바타이유는 그렇게 자본주의에 추방된 죽음을 지극한 잉여라고 부른다. 그렇게 분리된 삶과 죽음이 다시 하나로 연속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라야 비로소 상실된 비극도, 숭고도(그 자체 어쩌면 신성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해도 좋을) 되찾을 수 있는 일이다.
■ 고충환(Kho, Chung-Hwan 미술비평)전시제목이혜성: Nameless Flowers
전시기간2021.07.22(목) - 2021.08.14(토)
참여작가 이혜성
관람시간화-토요일 10:00am - 06:00pm
휴관일일, 월요일
장르회화
관람료무료
장소OCI 미술관 OCI MUSEUM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4 (수송동, OCI미술관) )
연락처02.734.0440
-
Artists in This Show
-
1991년 서울출생
-
OCI 미술관(OCI MUSEUM) Shows on Mu:umView All
Current Shows
-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수원시립미술관
2025.04.15 ~ 2026.02.22
-
취향가옥 2: Art in Life, Life in Art 2
디뮤지엄
2025.06.28 ~ 2026.02.2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봄의 선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5.09.05 ~ 2026.02.22
-
광복 80주년 기념 «향수(鄕愁), 고향을 그리다»
국립현대미술관
2025.08.14 ~ 2026.02.22
-
이강소_曲水之遊 곡수지유: 실험은 계속된다
대구미술관
2025.09.09 ~ 2026.02.22
-
전국광: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5.09.24 ~ 2026.02.22
-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
전북도립미술관
2025.11.14 ~ 2026.02.22
-
허윤희: 가득찬 빔
대구미술관
2025.11.04 ~ 2026.02.22